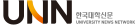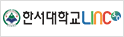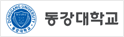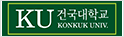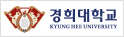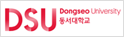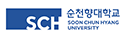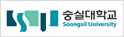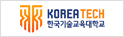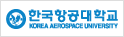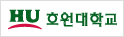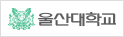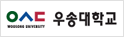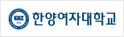대학 교육혁신 강조…"일자리 50% 사라진다" 미래 대비 필수
"4차 산업혁명 대비하려면 그에 따른 대학 여건 지원도 필요"

[한국대학신문 김소연·천주연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과 같은 탑다운 방식의 모델은 도움이 안 된다. 지금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오히려 대학 교육 혁신을 지연시킨다. 변화해야 할 대학들이 교육부 지시를 따르느라 변화를 못하고 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대비 대학교육 혁신방안' 포럼에서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은 현재 고등교육 정책을 이렇게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대비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세계적으로 2025년을 티핑 포인트, 세상이 바뀔 것으로 추측한다. 그렇다면 2025년까지도 우리나라 차세대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준비하도록 해야 할까. 장기적인 이슈로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대학입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또 4차 산업혁명에서 교사들의 역량도 중요하다. 교사 양성을 로스쿨처럼 2년제 교육대학원을 설치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교육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최근 많이 인용되고 있는 미국 애리조나주립대의 사례를 들면서 대학정책의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애리조나주립대는 모든 강의가 학생들이 지역 기업,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뤄진다. 프로젝트 기반으로 수업이 이뤄지며, 맞춤형 교육으로 낙오자를 만들지 않는다. 교수들은 소규모의 프로젝트 학습을 하고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e-어드바이저라고 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 기계가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준다. 10년 동안 69개 학과를 폐지하고 30개의 새로운 융합전공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4차 산업혁명에서 대학의 역할과 대학 교육의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 중 50%는 자동화 된다는 것이다. 새로 생길 직업을 대비해 교육을 시켜야 한다”면서 “직업의 50%가 자동화되지만 새로 생기는 직업이 더 많을 수 있다.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 인터넷, 소프트웨어, R&D, 제약 분야에서 직업이 늘어났다. 우리가 이런 분야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나. 대학 전공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이 중요하고, 대학이 지역의 혁신 허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은 '융합'이다. 대학 교수들이 자기 전공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있다.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주제로 연구해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교철 삼성전자 고문(포스텍 명예교수)은 실제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 기업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고, 대학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발표했다.
강 고문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코드 등 모두 아는 융합형 인재다. 이런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강 고문은 “삼성에서 3년 전 부터 시작한 것이 SCSA로 인문사회학 우수졸업자를 뽑아서 13개월 동안 컴퓨터 교육 및 다양한 연수를 진행했다. 3년 성과를 평가하기엔 어렵지만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다”면서 “대기업에서는 이런 교육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쉽지 않다. 때문에 대학에서 산학협력 교수를 활용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배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표에 이어 패널 토론에서는 김현주 명지전문대학 교수(정보통신과)는 대학 교육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ICT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서 ICT가 기본이다. 이런 부분에서 대학은 아직 수용할 준비가 덜 돼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모든 학문 영역은 아니더라도 정보통신 학문에 ICT가 융합돼야 하는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대학들이 과연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세계 우수 대학과 비교하면서 정작 대학교육에 지원이 부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에 대학교육 여건이 여전히 낙후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진 서울대 교수(컴퓨터공학)는 “학생 1인당 학교 운영경비를 비교하면 MIT나 스탠포드대 같은 경우 3억원이 넘는다. 반면 서울대는 등록금 700만원, 대학지원 1300만원 합해서 2000만원에 불과하다. 실제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서 소프트웨어 실험 실습실 1개를 7개 교과목 약 1000명의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다”면서 “양적, 질적으로 교육의 기본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를 위한 교육,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를 위한 이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산업체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패스트 팔로워다. 고급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보내면 이들이 과연 산업체에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